경제
[마흔엔튜닝] 두 번째 관객이 알려준 것
- 0
- 가
- 가

[도도서가 = 북에디터 정선영] “나 기타 치는 거 볼래?” “그래!”
며칠 전 집으로 놀러온 친구와 수다 삼매경에 빠져 있다가 급발진해 두 번째 관객 앞에서 기타 연주를 하게 됐다. 자세를 잡고 튜닝하는데 호기롭게 말할 때와 달리 떨리기 시작했다.
마음을 다잡고 이내 평소 연습할 때처럼 영화 <머니볼> OST ‘더 쇼’ 원곡을 틀어놓고 연주를 시작했다. 긴장한 탓인지 코드를 옮길 때마다 왼손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조금씩 어긋났다. 그나마 잘되던 오른손도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 망했다’
간주가 시작될 무렵 이때다 싶어 연주를 멈추고 친구에게 말했다. “음…이런 거야.” 그런데 친구 반응은 의외였다. “우아, 된다! 왼손을 어떻게 그렇게 움직여? 대단해!”
“그럼! 벌써 기타 배운 지 2년이 다 되어가는걸! 알잖아, 일이 숨넘어갈 정도로 바빠도 레슨은 안 빼먹은 거” 친구 말에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사실 친구가 한 이 말은 레슨 중 내가 선생님을 보며 자주 하는 말이다. “그게 어떻게 되죠?” “와… 진짜 대단해요!”
기타를 전혀 칠 줄 모르는 친구에게는 내가 그렇게 보였을까? 갑자기 나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졌다. 따지고 보면 기타 줄이 6개인지도 모르던 내가 이만큼 연주할 수 있게 된 것도 대단한 일인데, 나는 그 사실을 자꾸 잊고 만다.
좀처럼 코드를 외우지 못하는 것은 물론 외운 코드도 순간순간 까먹는 머리를 탓하고, 제 박자에 맞춰 코드를 바꾸지 못하는 왼손을 탓하고, 쉬운 리듬도 여러 번 반복되면 엉켜버리는 오른손을 탓한다. 타고난 손가락 힘이 부족해 줄을 제대로 짚지 못해 좋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을 두고는 농담처럼 이렇게 낳아준 엄마를 탓하기도 했다. 마흔도 넘은 어른이 이 무슨.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며 산다. 기타를 배우는 나는 선생님이 가장 큰 비교 대상이다. 눈앞에 가장 많이 보이는 비교 대상이 선생님이다 보니 내심 속상함의 연속이다. 머리로는 수십 년을 연주한 선생님과 나는 당연히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은 되는데) 왜 전 안 되죠?”라는 말도 자주 했다. 안 되고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말이다. 많이 서툴고 어설퍼도 지금 이만큼 기타를 치는 나도 대단한 거라는 걸, 친구는 알게 해주었다.
내 라이브 연주를 들은 첫 관객은 18개월 된 친구의 아기였다. 첫 번째 관객과 두 번째 관객 사이 10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실력이 늘었다고 단언할 순 없지만 “나 기타 치는 거 볼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자신감은 생긴 것 같다.
하면 된다. 수없이 좌절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엇이든 하면 된다. 자주 잊고마는 이 당연한 사실을 두 번째 관객 덕에 깨닫게 됐다. 고마워!

|정선영 북에디터. 마흔이 넘은 어느 날 취미로 기타를 시작했다. 환갑에 버스킹을 하는 게 목표다.
이지혜 기자 imari@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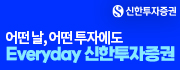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