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혜인의 반걸음 육아 36] 아이는 아이에게 배운다
- 0
- 가
- 가

[교사 김혜인] “왜 같이 타요?”
놀이터에서 아이를 내 무릎에 앉히고 그네를 타자, 꼬마 몇 명이 참견을 든다. 꼬마에게 대답했다. “아직 혼자 타는 게 무섭대.”
그러자 “저는 혼자 탈 수 있어요.”라고 꼬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와, 형은 혼자서 그네 탄대”라고 하자, 다른 꼬마가 옆 그네를 타며 “저는 서서 탈 수도 있어요”라고 한다.
아이들이 귀여워 웃음이 났다.
나는 가까운 놀이터를 두고 좀 더 떨어진 이곳에 일부러 온다. 늘 아이들이 많아서이다.
감각통합 치료사는 집에 그네를 장만해보라고 권했다. 치료 시간만으로 부족하기에 평상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놀이로 숙제를 내준 셈이다. 나는 바로 그네를 장만했지만 곧 팔아치워야 했다. 아이가 싫어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 시작은 이불 그네였다. 이불을 펼친 상태에서 아이가 이불 위에 엎드려 누우면 양쪽에서 이불을 잡고 들어서 좌우로 흔들어주었다. 아이가 어찌나 좋아했는지, 팔과 손목이 아프도록 이불 그네를 태웠다. 그러나 아이가 점점 더 자주 오랫동안 이불 그네 타기를 원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대안으로 해먹 그네를 장만했다. 아이는 이불 만큼은 아니었지만 꽤 좋아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문틀에 설치하는 유아용 그네도 마련했는데, 여기에서 뭔가 어긋난 듯했다.
처음 유아용 그네를 태웠을 때 아이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표정이었다. 며칠 뒤부터는 그네에 태우려 하면 발을 버둥대며 싫어하다가 막상 태우면 괜찮아지곤 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는 타려고 하지 않았다.
이불과 해먹은 천이 몸을 감싸는 안정감이 있지만, 문틀에 설치한 그네는 단단한 재질이다. 또 이불과 해먹으로 그네를 탈 때는 아이가 누워서 좌우로 흔들리는 경험을 했지만, 문틀 그네는 앉아서 앞뒤로 타는 그네였다. 아이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라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아이는 점차 문틀 유아용 그네는 물론이고 해먹 그네와 이불 그네마저 거부했다.
그래도 숙제는 계속 하기로 했다. 대신 집 근처 놀이터 중 그네가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 처음에 아이는 당연히 그네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도 그네는 종종 순서를 기다려야 하던, 인기 있는 놀이기구였다. 놀이터에 가는 날이 많아질수록 아이가 그네를 타는 아이들에게 눈길을 주었고, 드디어 나에게 안겨서 타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이 혼자 앉아 보게 시도하면 늘 허리를 뒤로 젖히며 발을 버둥거렸지만, 가끔 아이가 빈 그네를 만지작대는 모습을 보며 내년쯤에는 혼자 앉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내 예상은 지난주에 아주 기분 좋게 빗나갔다. 멀리 사는 언니를 만난 날이었다. 언니네 둘째가 여섯 살인데, 늘 동생이던 녀석이 사촌 동생이 왔다고 제법 형 노릇을 했다.
해가 어둑해질 무렵에 함께 놀이터에 갔다. 아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내게 언니는 “그냥 자기들끼리 놀라고 좀 둬”라고 했다. 내 보기엔 여섯 살도 너무 어리기만 한데, 조카는 세 살짜리 동생을 살뜰히 챙겼다.
조카가 그네에 앉자 내 아이도 졸졸 따라가 옆 그네에 섰다. “쟤가 아직은 혼자서 못 타.” 언니에게 얘기하며 아이에게 갔다.
아이는 평소처럼 내게 팔을 뻗지 않고 마치 준비가 됐다는 듯이 서 있었다. “혼자 앉아 볼래?” 하고 아이를 안아 들었는데, 발을 버둥거리지 않았다.
곧 내가 앉혀주는 대로 순순히 그네에 엉덩이를 대더니 그넷줄을 꽉 잡았다.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등을 살살 밀어주자 아이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듯이 환하게 웃었다.
여섯 살짜리 조카가 사촌 동생에게 보조를 맞추어 옆에서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그네를 탔다. 아이가 형을 보면서 더욱 즐거워했다.
그날 아이는 정말 오랫동안 그네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오늘도 한낮 더위가 지나자마자 놀이터로 향했다. 제법 큰 남자아이 한 무리가 왁자지껄 그네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이는 그네가 비어 있을 때보다 누군가 그네를 타고 있으면 좀 더 타고 싶어 한다. 아이가 슬금슬금 그네 앞으로 가자, 형들은 양보하는 티도 내지 않고 슬쩍 비켜 준다.
아이를 그네에 앉힌 뒤 밀어주고는 나도 옆 그네에 앉아 보았다. 조카가 그랬듯이 속도를 맞추어 똑같이 타면서 아이를 쳐다보았다. 아이는 아주 편안한 표정이었다.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나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다. 참 고마운 여섯 살짜리 조카, 지난 4개월 동안 스쳤던 이름 모를 아이들. 아이는 아이에게 배운다.

|김혜인. 중견 교사이자 초보 엄마. 느린 아이와 느긋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교사 김혜인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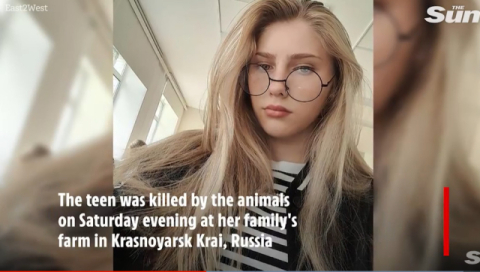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